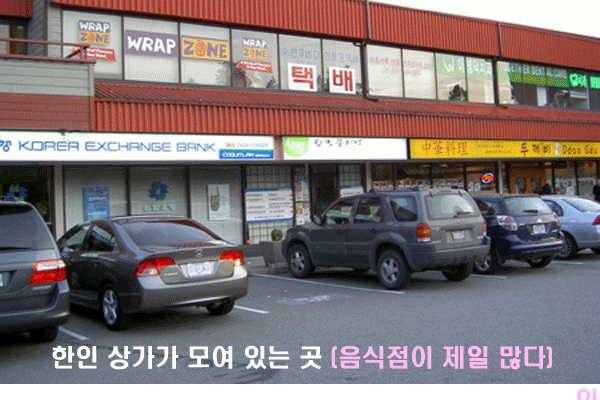학력? 묻지마~~ 다쳐~
2008. 5. 8. 05:08ㆍ벤쿠버의 일상
|
작년에 대학 교수로 있는 후배가 밴쿠버를 방문했었다.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하는데, 나를 만나기 전 아주 친했던 친구를 만나고 오는 길이라 하면서, “그 친구가 여기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줄 몰랐어요.”라고 한다. “뭐 하는데…?” “글쎄 … 몰 안에서 커피를 팔더라구요. 종일 서서 샌드위치랑 와플을 만들어 판데요… 공부도 잘했고 똑똑했는데…” 하… 나는 갑자기 할말이 끊기고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거기 사람들도 많고 장사도 잘되고... 괜찮은 곳이야..." 라고 괜히 내가 변명하듯 웅얼거렸지만, 속으로는 -아니, 생선 배를 따는 직업이던, 닭 목을 비트는 직업이던 무슨 상관야, 여기는 부자 할머니들도 파트 타임 뛰어 용돈 벌어 쓰는데.... 서울처럼 외관에, 체면에… 그런거 안 따져- " 하고 싶은데,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보니 나도 서울 틀을 아직 못 벗었나 보다. “선배는 어떻게 지내요?” “그냥… 놀지.” “와~ 능력있네~” 뭔 소리여? 쓴 웃음이 나온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무위도식 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니. 써준다는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고 노는데.... 아는 분 중에 세탁소를 15년 넘게 하시는 분이 있다. (S 대 출신인 것을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 알았다.)서울에 사실 땐 큰 기업체를 책임 맡고 계셨던 분인데, 처음 이민 와서 곧 바로 세탁소를 시작해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다. 부인은 옷 수선을 하는데 항상 겸손하고 낙천적이라 누구든지 좋아하고 주로 서양인들이 오랜 단골이다. 20여년 전에 서울에 살 때 운전수를 부리며 사시던 분들이지만, 지금 생활에 불평 한 마디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언젠가 다운타운에서 구두 수선하는 분의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 보게 되었다. Y대 상대를 나왔다는 그 분은 30년 가까이 구두 수선을 하는데, 월 수입이 만 불이 넘는다고 한다. 그만하면 이곳에선 성공한 사업가인데, 대학 동창들이 캐나다에 가서 냄새 나는 구두나 고치고 있다고 많이 수근거려 동창이 밴쿠버에 와도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글쎄… 보기에도 좋고, 경제적인 면도 좋은 사업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전문직인 경우만 제외하곤 그런 분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 곳에선 그저 자기의 품을 팔아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직업이 무엇이든 땀흘리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 감사하지 않은가? 어쨌든지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려면 일류 대학 학벌, 그거 별로 써 먹을 곳이 없다. |
'벤쿠버의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회 야외예배 (0) | 2012.07.30 |
|---|---|
| 소리없이 들어 선 가을 (0) | 2011.08.31 |
| 못 말리는 병 (0) | 2008.04.13 |
| 캐나다의 빈곤 (0) | 2008.04.12 |
| 서울, 그 거리의 사람들 (0) | 2007.10.15 |